어쩜 이렇게 아이들 가까이에서 세상을 살펴볼 수 있을까. 김중미 작가는 참 놀랍다.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읽은지 20년이 지났다. 그때 그 이야기가 아무 이질감없이 읽혔던 까닭을 지금에야 알게 된다.
느티나무 홍규목의 독백으로 시작되는 책은 진지하지만 소박하고 귀엽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귀옆에서 들리는 듯하고, 도깨비같은(사실 도깨비가 맞는지도 모를) 느티샘은 알면 알수록 신비롭기보다 친근하고 따스하기만 하다. 자신의 모습을 일부러 숨기거나 도망다니지 않고, 찾는 이에게는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느티샘. 그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오래 전 마을마다 한 그루씩은 있던 커다란 당산목, 느티나무 그 자체다.
이 이야기가 더 멋진 이유는 '느티나무 수호대'인 홍규목을 지키려는 대포읍 아이들의 노력만을 그리고 있지 않아서다. '레인보우 크루'라는 댄스팀과 도훈이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레인보우 크루 2기'는 결국 댄스대회에 나가지 않는다. 홍규목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이 되거나 명확하게 그를 영원히 보호한다는 정책이 마련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한다. 아이들은 느티샘의 기억 속에서 느티샘, 그러니까 홍규목을 지키는 것보다 자연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홍규목 안의 공간과 자신들을 돌봐줄 느티샘의 존재 자체보다도 '환대'였으며, 그것은 자신들에게만 부족하고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 이야기를 읽지 않아도 자연을 외면하고 환대하지 않게 변한 인간 사회와 그 안에서 또다시 환대받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을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이 이야기를 보고서야 떠올린다. 서로를 환대하고 지켜주는 일은 그리 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만 생각하고 서로를 미워했을까. 이유가 있든 없든 쉽게 외면하고 경계선을 그어온 나 자신의 모습부터 돌아보게 됐다. 홍규목의 말처럼 혼자서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 서로 도와주고 보살펴야 하며, 특히 어린 생명들에게는 가르침과 사랑, 그러니까 환대가 더 많이 필요하다. 지금 세상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얘기한다. 이것이 착각이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대와 관심,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자라왔던가를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만이 오래도록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잘 살아가야하는 이유 역시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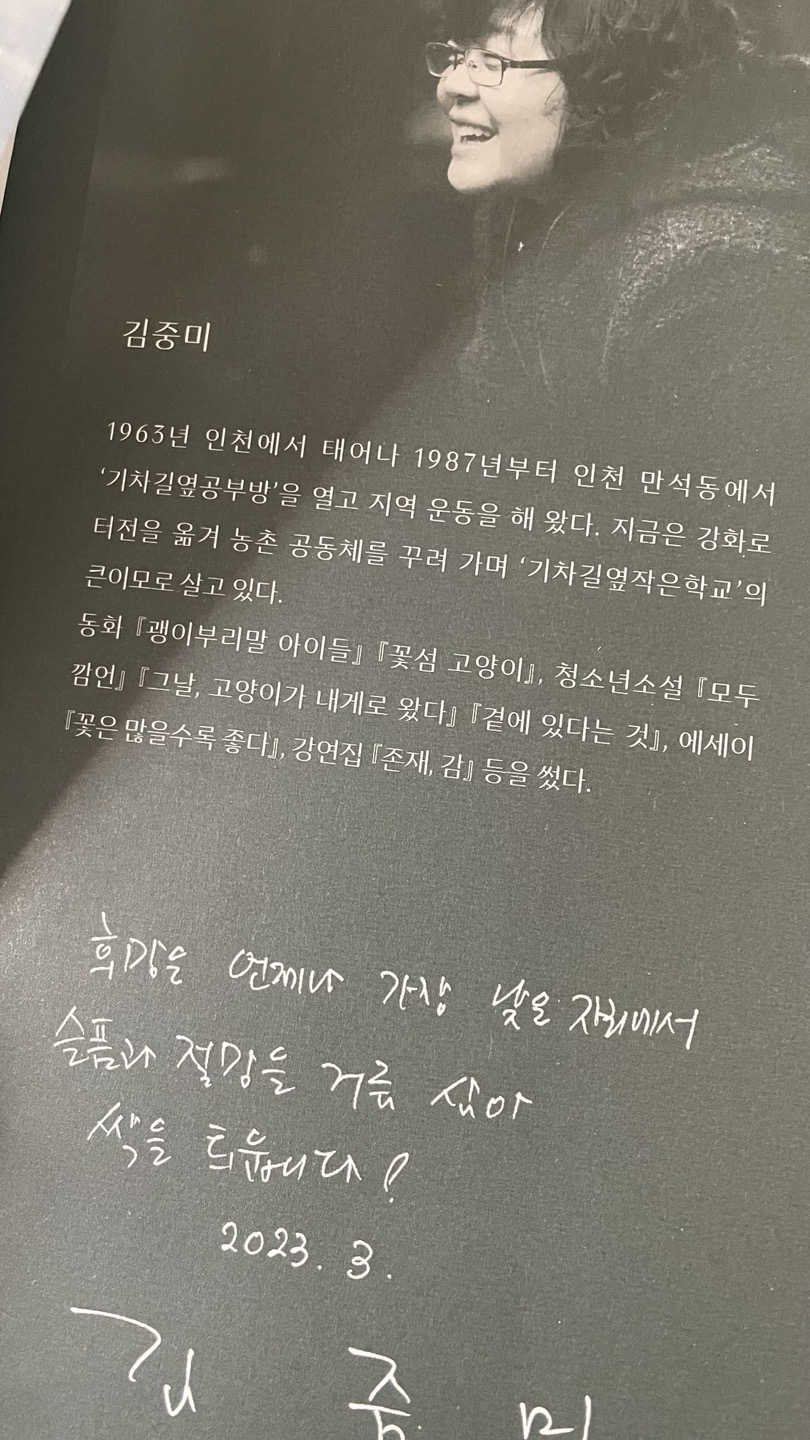

'敖번 국도 >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레이디 맥도날드] 한은형, 문학동네 (0) | 2023.04.21 |
|---|---|
| [쇼코의 미소]최은영, 문학동네 (0) | 2023.04.21 |
| [림: 쿠쉬룩] 서윤빈 서혜듬 설재인 육선민 이혜오 천선란 최의택, 열림원 (0) | 2023.04.07 |
| [니 얼굴: 은혜씨 그림집] 정은혜, 보리 (0) | 2023.03.29 |
| [비비안 마이어: 거울의 표면에서] 파울리나 스푸체스/박재연, 바람북스 (0) | 2023.0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