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에는 그래도 송도 돌아오고 나서 다시 도서관도 가고 읽던 책들도 다 읽으려고 나름 애썼던 것 같다. 처음으로 송도에서 혜화동까지 대중교통으로 병원도 갔다오고. 고양이를 데려오려고 여러가지고 고민하던 시기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책을 많이 보긴 했다.
1. 바다의 노동자: 드디어 다 읽었다. 제주에 읽으려고 가지고 갔지만, 게으른 하루 숙소에 있던 책을 먼저 읽고, 이 책은 거의 가방에서 무게만 차지했다. 그래도 서울 올라오고 나서 마저 읽고 송도에 와서 끝까지 읽었다. 뒤로 갈수록 재미있었고, 선생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했고 그리웠다.
질리아, 였나.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인 것처럼 나왔으나, 바다에서 고군분투하고 돌아온 뒤 그가 사랑한 그 여자(이제 이름이 기억 안 나..)가 약속을 저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진정 사랑하는 신부와 결혼할 수 있도록 기지와 용기를 발휘하는 것은 정말 멋있었다. 뭔가 '남자다웠다' '기사도적이다'같은 진부한 말로는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뒤로 다시 돌아왔을 떄 그를 아들로 삼겠고, (수양)딸을 그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선장의 마음도 알겠고, 나름 아름다웠으며 그 딸의 마음도... 이해는 갔다.
사람의 인연(운명 아니고)은 미리 정해져있는지도 모르고, 고군분투하고 약속을 하는 것으로 얻어지거나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질리아가 너무너무 멋있었다.
바위틈에서 고군분투하는 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세세한 묘사도 굉장히 멋졌다. 글이 써있는 대로 나는 상상을 온전히 못하는 편이다. 특히 공간적인 것. 그렇지만, 아무튼 멋있다...고 느끼긴 했다. 뭔가 웅장하고 밀물고 썰물이 들이치고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하는 바다 위 암초 풍경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다.
2. 우아한 언어.
제주 세화의 마고책방에서 산 책. 사장님이 표시해놓으신 부분도, 남겨놓으신 메모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집어들었다. 독립출판물이 아니라서 살까말까 망설였지만, 다른 책이 크게 맘에 드는 것이 없어서 결국 샀다.
책이든 영화든 보고 나서 다른 책/영화/인물 등 새로운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것이 정말 좋은 책/영화 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읽다보면 여기에 나오는 책을 보고싶어진다, 라고 하셔서 '딱이다'라고 생각했다.
표지에 써있는 것들이 각 장의 제목이다. 이제 오래되니 책의 구성이나 내용이 정말 기억이 나지않지만... 책은 읽고 나서 미사 서점에 갖다 팔았고 ^^
책 장마다 하나의 사진이 같이 들어있던 게 인터넷 서점 책 소개를 다시 보고 나니 생각이 나네.
이 장을 찍어뒀던 게 컴퓨터에 있다(HEIC 파일이라서 복붙이 안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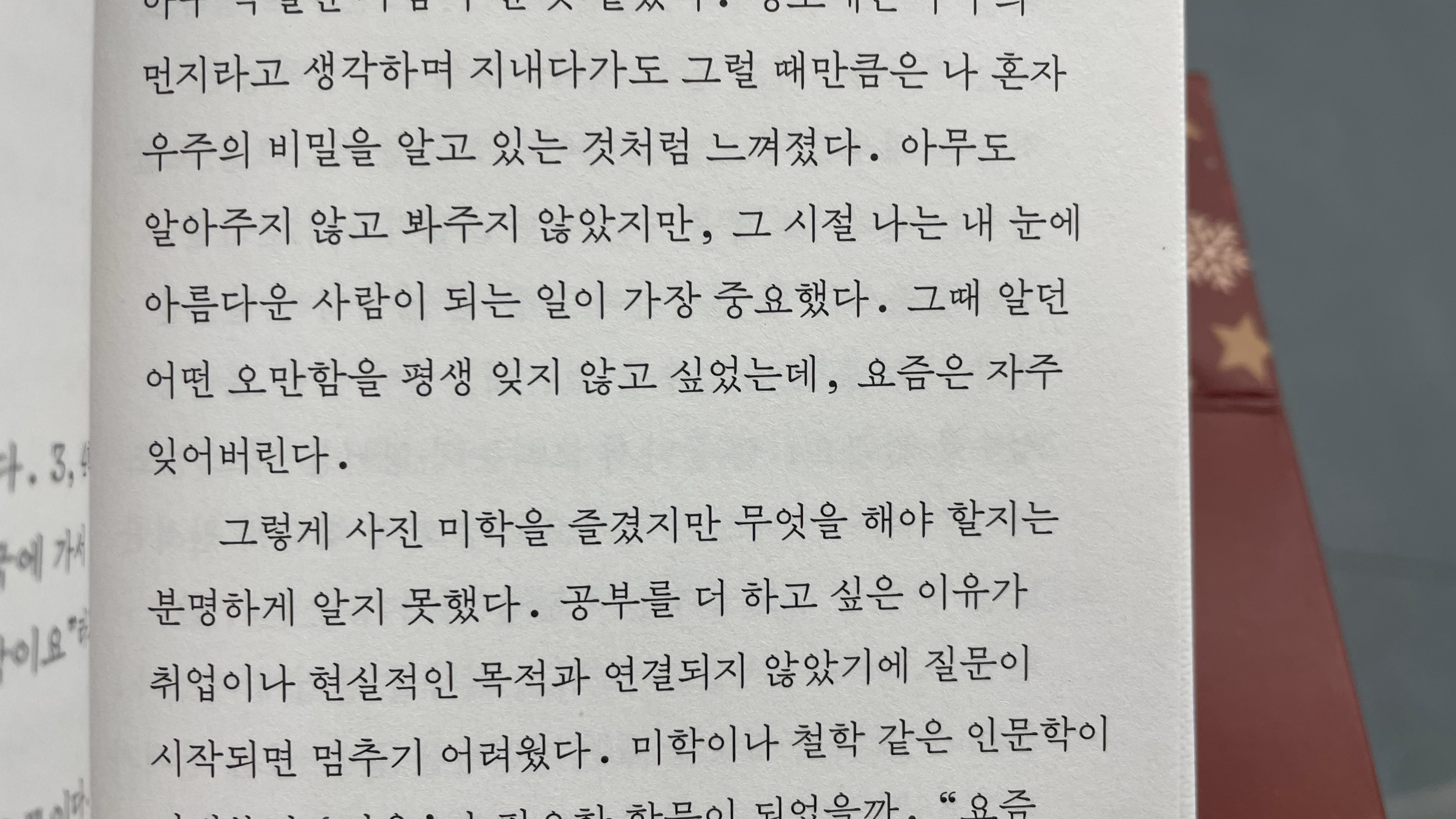
이 부분, "오만함"에 대한 작가의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 나도 이제와서, 이십대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게 되는데, 그 마음과 태도, 생각의 차이가 작가가 한 아름다운 사람과 오만함에 대한 말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다.
3. 살림 비용
이건 작년 2월 초. 두번쨰 강연날이었으니까. 마포 도서관에 강연하러 갈 때 엄마랑 같이 가면서 서점책방 리브레에 가서 산 거다. 엄마가 이걸 두고두고 당신이 사줬어야 하는데, 라고 하셨지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걸...
이 책이 데버라 리비의 세 권짜리 연작인데, 첫 번쨰 책인 <알고싶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었던 터라 언젠가 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엄마가 이 책이 작가가 이혼하고 자식들을 분가시키고 혼자 독립하여 살면서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것이라는 내용때문에 읽고싶어하신 지도 꽤 되어서 구입을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다. 좀 공감하기도 힘들고 문장이 아름답거나 하지도 않았던 느낌? 그리고 글씨가 작아서 엄마가 읽기에는 힘이 드셨고...
그래서 이 책도 결국 미사 서점에 갖다 팔았다.
<알고싶지 않은 것들>도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 남아공인가에서 흑인이고 소녀로 살아가는 동안 겪었던 드러나지 않지만 너무 와닿는 여러 차별에 대한 이야기였고, 굉장히 재밌고 인상깊었던 기억이 있다.
4. 비바,제인
이 책은 시점이 매우 특이했다 제인에 대한 이야기이며,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 예쁜 여성, 정치스캔들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 핵심어들을 들었을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맞는데, 제인을 알고 있는 사람-엄마, 딸, 이웃, 상사 등의 입장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제인에 대한 소문을 제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접하고 피할 수 없는 제인 주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인을 알아가게 된다.
진짜 좋았다. 새로운 시각의 여성주의 소설이었고,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스캔들 이야기인데 이렇게 재밌다니? 감동적이라니? 하기까지 했다. 시점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 (역시나 글이 길어짐에 따라 분석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 누구도 어떤 상황이라도 누구를 비난할 수는 없다는, 보편적이지만 정말로 지켜지지 않는 규칙(이걸 규칙이라고 해야하나? 요즘 점점 어휘력이 떨어진다)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다는... 또 최근에 유진이가 만나서 했던 상대방을 '판단'하지않으려 애쓴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하는 소설이다..
5. 두 늙은 여자
추운 겨울, 이동하던 인디언 부족의 두 노인 여성이 버려진 뒤 살아남는 이야기다. 아주 특별한 지혜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여성, 그리고 노인이 혹독한 조건 속에서 살아남게 되고, 그들이 일궈놓은 새로운 터전에 그들의 자손들이 다시 돌아오게까지 되는 이 이야기를 보고 나면, 지혜라는 것이 특별히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구나. 자연스레 일어나는 일련의 일상적인 일들과, 그 일들이 녹아서 흘러간 시간들이 모여 '지혜'라는 게 드러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든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게, 살아남는다는 게 전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음식과 물을 먹고, 또 깨끗하게 몸을 씻고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잘 자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도 생각하게 한다 새삼.
6. 한떄 소중했던 것들
이 책이 뭔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 검색해보니 이기주작가 산문집이네. 언어의 온도, 를 쓴 작가.
어지간히 재미없었나보다
아무 기억이 안남.
1월에 책 많이 읽었다. 이제 점점 적게 읽을건데, 여기서 글 마무리.
'敖번 국도 >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월부터 7월 13일까지 (3) (7) | 2024.07.13 |
|---|---|
| 1월부터 7월 13일까지 (2) (0) | 2024.07.13 |
| [스톤매트리스] 마거릿애트우드 (0) | 2024.06.09 |
| [과유불급] 힙한 북클럽 24.3.29 (1) | 2024.04.01 |
| [자기만의 방으로] 오후의 소묘 (1) | 2024.02.06 |
